한류의 새로운 진화, ‘ 한국의 일상화’

한류가 새롭게 진화하고 있다. 단순히 K팝이나 K 드라마에 빠지는 수준이 아니다. 이제는 한국이 ‘일상화’되고 있다. 과거 미국 할리우드의 영화나 드라마에서 한국인은 언제나 ‘이방인’으로 취급됐다. 그런데 이제는 더 이상 그런 시선이 느껴지지 않는다. 그냥 그들 옆에 자연스럽게 있는 ‘이웃’이 되어 버린 것이다. 또 K푸드가 약진하는 것도 과거 한류와 달라진 점이다. 이제는 ‘한국’ 하면 K팝보다는 K푸드를 떠올리는 사람이 현저하게 많아졌다. 그 결과 ‘토종 한국인처럼 놀고 싶다’라는 새로운 욕구가 생기고 있다. 한류의 새로운 차원이 열리고 있다는 이야기다.
‘서울 토박이’처럼 경험하고 싶은 외국인들

최근 일본 지상파 TBS에서 방송하는 한 드라마에서 매우 이색적인 장면이 등장했다. 인기 드라마 ‘아이 러브 유’(EYE LOVE YOU)에 한국어가 자막 없이 흘러나왔던 것이다. 방송사고가 아닌 다음에야, 이는 한국어를 ‘일상’으로 받아들였다는 것 이외에는 설명이 되지 않는다. 실제 드라마 내용도 한국인 유학생 태오(채종협)와 일본인 직장 상사 모토미야 유리(니카이도 후미) 의 로맨스물이다. 실제 이 드라마에 나오는 한국어를 이해하기 위해 한국어 공부를 하는 일본인들이 부쩍 늘었다는 소식도 전해져 오고 있다. 일본 매체는 ‘드라마가 매개되어 한국어 공부 열풍이 부는 건 20년 만이다’라고 진단하기도 했다. 심지어 일본 여학생들 사이에서 이제 한국어는 일상어가 되었다. ‘진짜’, ‘오빠’, ‘대박’이라는 말들은 더 이상 외국어가 아닌, 청소년들 사이에서는 그냥 일본어와 함께 쓰는 일본어일 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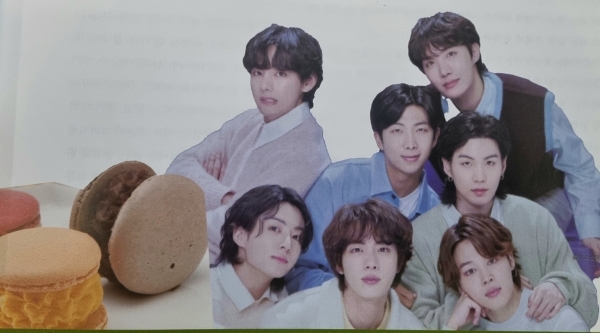
또한, 이제 미국에서도 더 이상 한국을 이질적인 국가, 변방의 외국으로 취급하지 않는다. 넷플릭스에서 반영되는 <엑스오, 키티>는 한국 고등학교를 배경으로 하는 미국 하이틴 드라마이다. 등장인물은 소파에 앉아 일상적으로 한국 프로그램을 보는 장면이 나타나기도 한다. 그저 평범한 미국인 학생의 삶에서 한국이 너무도 자연스럽게 그려지고 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이제 한국이 너무 일상화되었기 때문에 특별한 것이 되지 않았다라’고 진단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넷플릭스에서 영어를 제외하고 가장 많이 소비된 언어 역시 한국어였다.
미국 에이치비오(HBO)가 제작한 브라질 오리지널 드라마 <옷장 너머로>는 10대 소녀가 신비로운 포털을 통해 케이팝 스타와 만나는 로맨틱 판타지 장르다. 수년 전만 해도 ‘외국인이 미국인을 만나고 싶어 한다’라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이제는 ‘외국인이 한국인을 만나고 싶어 한다’라는 낯선 주제가 드라마의 내용이 되고 있다.
또 이제는 K팝보다는 K푸드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된 것도 이를 방증한다. 보통 음식이란 하루 삼시세끼 자신의 개인적인 일상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그래서 지극히 개인적인 취향이기도 하며, 자신이 만족할 만한 메뉴를 선택하게 된다. 그런데 이제 한국 음식이 그들에게 많이 선택받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한국이 일상화됐다는 또 다른 반증이기도 하다. 더구나 이제는 김밥이나 라면에 한정되지도 않는다. 멸치, 주꾸미볶음, 어묵, 만두, 냉동 볶음밥, 간장게장 등 한국인들이 일상에서 먹는 거의 모든 음식이 SNS를 통해서 전 세계로 전파되고 있으며 외국인들이 이를 선택하고 있다.

이러한 일이 벌어지자, 세계 최고의 경영대학원이라는 미국의 하버드 경영대학원(Harvard Business School)이 ‘K푸드 세계화 성공 과정’을 연구 사례로 선정해 교재로 채택하기도 했다. 이 교재에서 하버드대학교 교수는 ‘한국의 K컬처는 전 세계 국경을 넘나드는 ‘문화 현상’이 됐다. K푸드는 이를 통해 국제적으로 함께 조명받게 됐고, 한식 시장의 규모까지 덕분에 글로벌 수준으로 확장됐다’라고 분석하고 있다. 이는 단순히 사람들이 많이 사 먹기 때문이 아니다. 이제는 아직 문화가 되고 트랜드가 되어버렸다. 미국 식음료 트랜드 컨설팅 업체 에이에프앤드코(Af&co)는 올해 1월 ‘2024년 식음료 트랜드’ 10가지를 꼽으면서 이 중 가장 먼저 ‘한식’을 언급했다. 심지어 지난해 구글에서 가장 많이 검색된 음식 이름이 바로 한국 음식인 ‘bibimbap(비빔밥)’이었다고 한다.
한국 자체가 문화가 되었다

한국의 일상화라는 이러한 새로운 차원의 한류는 또 다른 한국 여행의 스타일을 만들어 냈다. 바로 ‘서울 토박이(Seoul Local)’처럼 일상을 즐기고 싶다는 욕구이다. 2023년 9월 뉴욕타임스(NYT) 여행 면 톱기사의 제목은 ‘서울 토박이(Seoul Local)처럼 먹고, 놀고, 갤러리 여행하는 법’이었다. 이는 단순히 과거처럼 K팝을 듣고, K드라마를 듣는 방식의 한류 체험 방식을 넘어선다. 이러한 욕구 덕분에 2024년 한국 정부는 외국인 방문객 수가 사상 최대였던 2019년의 1,750만 명보다 250만 명 더 많은 2,000만 명 달성으로 정했다.
과거와 달라진 또 하나의 문화 현상이라면, 이제는 ‘날 것 그대로의 한국’을 선호한다는 점이다. 과거에는 한국 문화를 세계인에게 이해시키기 위해 한국을 그들의 관점에서 윤색하고 편집해서 보여주었다. 그래야 한국에 대한 이해가 빨랐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제 어느 정도 한국이 알려지자, 상황은 완전히 반전되었다. 외국의 시선에서 윤색된 한국이 아니라, 한국 그 자체로서의 한국적인 것을 더 선호하게 된다는 점이다. 옥스퍼드 영어 사전에 한글의 발음표기를 그대로 살린 단어가 많이 실리고 있다는 사실은 이러한 달라진 외국인의 관점을 잘 보여준다.

이러한 여러 가지 모습들은 이제 ‘한국 자체가 문화가 됐다’라고 말해도 크게 무리는 없다. 해외에서 연구 활동을 하는 한국인 교수들은 ‘한국이 독자적인 문화가치로 정착되었다’라고 평가하고 있다. 이는 곧 그간 따로따로 떨어졌던 K팝, K푸드, K드라마가 아니라, 이 모두가 다 합쳐진 ‘한국 그 자체’를 전 세계인이 사랑하게 되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한 나라의 언어, 문화, 영화, 음식, 음악에 이어 가전 제품까지 전 세계로 펴지게 한 나라는 전 세계에서 미국 하나뿐이었다. 물론 일본도 이러한 문화 전파를 했지만, 지금의 한류같이 전면적이지는 못했고, 그 유행의 시간도 매우 짧았다. 그러나 이제 한류는 완전히 새로운 형태가 되어 과거 미국이 했던 문화 전파의 힘을 뛰어넘고 있다. 심지어 한 국가의 언어가 그 나라 청년들 사이에서 미래를 좌우하는 경우도 그리 많지 않았다. 그래봐야 영어가 실력이 되는 정도였다. 하지만 이제 한국어는 단순히 ‘배우면 좋은’ 언어가 아니라, ‘배우면 인생이 달라지는’ 언어가 되었다. 이는 과거처럼 한국보다 못사는 나라에 해당하지는 않는다. 일본과 같은 선진국에서조차 한국어를 배워서 미래에 한국 영화시장에서 일을 해보고 싶어 하는 청소년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는 한국인 산업적인 차원에서도 세계적인 강국으로 인정받고 있다는 의미라고 할 수 있다.
과거의 한류에 대해서는 많은 전문가는 ‘언제 사그라질지 모른다’라는 우려를 많이 하곤 했다.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사그라들’ 걱정보다는 어떻게 하면 더 확장할 수 있는지에 대한 행복한 고민이 있을 뿐이다.


